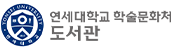조금은 삐딱한 세계사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

- 저자 :원종우
- 출판사 :역사의아침
- 출판년 :2013-04-13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9-09)
- 대출 0/2 예약 0 누적대출 146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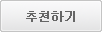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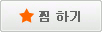
역사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유럽의 내면
당신의 역사적 상식에 물음표를 던진다!
모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감추어둔 이면의 역사를 놓칠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관한 지식이 과연 진리일까?”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한 승자에 의해 쓰이는 역사의 오류를 지적하고, 승자의 역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순진한 자세에 딴죽을 건다.
딴지관광청(현 노매드21)에 〈파토의 유럽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약 5년 동안 연재된 내용을 보완하고 정리한 이 책은 끊임없이 질문한다. ‘유럽(인류)의 역사는 시간순으로 발전하고 진화했는가?’ ‘나폴레옹은 위대한 영웅이고 히틀러는 독재자였나?’ ‘영국의 명예혁명은 정말 명예로웠는가?’ ‘우리는 근대를 지나 현대에 살고 있는가?’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이미지, 미국의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는 유효한가?’ 등 우리의 역사적 상식에 물음표를 던지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파토 원종우의 기발하고 비범함 유럽 읽기
삶 속에 묻어 나온 유럽 이야기들
그렇다면 왜 유럽인가. 저자 원종우(인터넷 필명 파토)는 1980년대 한국의 문화적 폐쇄성과 무지, 또 그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우리나라의 정치적 탄압·독재와 자유의 제한, 한국 전반에 느껴지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와 보수성,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억압 등을 겪으며 이 모든 비(非)이성적인 상황들이 곧 ‘근대 사회(인간적ㆍ이성적인 사회)’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어 캐나다에서의 생활 2년, 영국에서의 유학생활 4년 동안 한국과 전혀 다른 유럽인의 삶과 사고방식, 문명 등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간정신이 무엇인지 깊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정신(인간정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제도적 바탕이 만들어진 유럽과 서구 문명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럽의 이야기에 관한 집필을 시작했다.
이 책은 근대의 인간정신을 향해 나아가던 인류의 노력, 시행착오, 좌절, 성취의 역사와 그 중심에 있던 집단과 개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이 관점을 토대로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의 유럽을 탐험한다.
좌절과 극복의 관점에서 살펴본 유럽의 역사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발전만 거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는 유일신사상인 기독교의 배타성과 게르만족의 야만성이 유럽을 지배하면서 퇴행된 인문주의적 가치를 되찾아오기 위한 과정이었고, 현대의 전쟁과 야만은 근대의 유럽보다 퇴화된 정신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또한 유럽의 중세는 고대 로마시대의 지배방식보다 퇴행되었으며 십자군 전쟁과 마녀사냥은 광기와 무지의 소산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교황의 무오류성 관점이 횡행하던 시기도 있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이 관점은 현재에도 ‘빨갱이 사냥’ ‘이집트 전쟁’ 등 끊임없이 모습을 달리한 채 이어지고 있음을 고발한다.
인류의 역사를 ‘발전’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과 ‘좌절의 극복’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후자의 관점을 통해 자칫 놓쳐버릴 수 있었던 ‘승자의 기록’ 그 이면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오류’를 이해하는 순간 독자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책이 던진 수많은 물음표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승자의 기록이 남긴 환상에서 벗어나, 인류에게 수많은 오류가 있음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절대적 선이나 악이 아니며 단지 이익에 의해 선 또는 악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저자는 이 이상적인 삶의 가능성을 ‘유럽의 근대정신’에서 발견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보내는 따끔한 충고
이 책은 고대와 중세, 근대에 이어진 유럽의 과거사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캐나다와 영국, 오스트리아에서 10여 년간 살며 직접 부딪힌 현대 유럽의 삶 이야기를 각 꼭지 마지막에 넣어두기도 했다. 저자는 이 꼭지들을 통해 한국인이 가진 선진국에 대한 환상(64쪽), 백인의 친절함에 숨은 뜻(195쪽) 등 백인 사회의 허구성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백인 사회가 느린 이유(27쪽), 영국의 반전시위의 의미(346쪽), 21세기 유럽의 위치(276쪽)를 살펴보며 우리가 유럽 사회를 통해 배워야 할 점들을 객관적으로 나열하기도 한다. 또 과연 한국인은 단군왕검을 기점으로 한 단일민족이 맞는지(224쪽),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은지(276쪽) 등을 살펴보며 한국의 민족주의와 폐쇄성,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따끔한 비판도 놓치지 않는다.
유럽사의 또 다른 축, 은비주의적 이야기
‘외전’이라는 부록을 책에 마지막에 실어놓은 점은 특이하다. 저자는 정사(正史) 못지않게 야사(野史)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사는 기록과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세상사의 큰 줄기를 그린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섬세한 감정, 우연과 착각 등 우발적 요소, 그 밖에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흐름을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는 이를 어른들의 동화일 뿐이라고 단정하지만 실제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사실 외전에 실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백인 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그들의 정신세계와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외전이라는 이름으로 본문에 포함시켰다.
외전에서는 유럽과 미국을 이끈 프리메이슨(Freemason)의 존재, 프리메이슨을 있게 한 성당기사단(Knight Templar)의 은비(隱秘)주의적 이야기, 프리메이슨의 성지가 된 프랑스 파리의 상징적인 의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숨은 비밀 등을 살펴본다. 그 어떤 교과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들은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유럽의 숨은 이야기를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역사적 상식에 물음표를 던진다!
모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감추어둔 이면의 역사를 놓칠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관한 지식이 과연 진리일까?”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한 승자에 의해 쓰이는 역사의 오류를 지적하고, 승자의 역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순진한 자세에 딴죽을 건다.
딴지관광청(현 노매드21)에 〈파토의 유럽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약 5년 동안 연재된 내용을 보완하고 정리한 이 책은 끊임없이 질문한다. ‘유럽(인류)의 역사는 시간순으로 발전하고 진화했는가?’ ‘나폴레옹은 위대한 영웅이고 히틀러는 독재자였나?’ ‘영국의 명예혁명은 정말 명예로웠는가?’ ‘우리는 근대를 지나 현대에 살고 있는가?’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이미지, 미국의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는 유효한가?’ 등 우리의 역사적 상식에 물음표를 던지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파토 원종우의 기발하고 비범함 유럽 읽기
삶 속에 묻어 나온 유럽 이야기들
그렇다면 왜 유럽인가. 저자 원종우(인터넷 필명 파토)는 1980년대 한국의 문화적 폐쇄성과 무지, 또 그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우리나라의 정치적 탄압·독재와 자유의 제한, 한국 전반에 느껴지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와 보수성, 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억압 등을 겪으며 이 모든 비(非)이성적인 상황들이 곧 ‘근대 사회(인간적ㆍ이성적인 사회)’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어 캐나다에서의 생활 2년, 영국에서의 유학생활 4년 동안 한국과 전혀 다른 유럽인의 삶과 사고방식, 문명 등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간정신이 무엇인지 깊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정신(인간정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제도적 바탕이 만들어진 유럽과 서구 문명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럽의 이야기에 관한 집필을 시작했다.
이 책은 근대의 인간정신을 향해 나아가던 인류의 노력, 시행착오, 좌절, 성취의 역사와 그 중심에 있던 집단과 개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이 관점을 토대로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의 유럽을 탐험한다.
좌절과 극복의 관점에서 살펴본 유럽의 역사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발전만 거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는 유일신사상인 기독교의 배타성과 게르만족의 야만성이 유럽을 지배하면서 퇴행된 인문주의적 가치를 되찾아오기 위한 과정이었고, 현대의 전쟁과 야만은 근대의 유럽보다 퇴화된 정신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또한 유럽의 중세는 고대 로마시대의 지배방식보다 퇴행되었으며 십자군 전쟁과 마녀사냥은 광기와 무지의 소산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교황의 무오류성 관점이 횡행하던 시기도 있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이 관점은 현재에도 ‘빨갱이 사냥’ ‘이집트 전쟁’ 등 끊임없이 모습을 달리한 채 이어지고 있음을 고발한다.
인류의 역사를 ‘발전’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과 ‘좌절의 극복’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후자의 관점을 통해 자칫 놓쳐버릴 수 있었던 ‘승자의 기록’ 그 이면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오류’를 이해하는 순간 독자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책이 던진 수많은 물음표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승자의 기록이 남긴 환상에서 벗어나, 인류에게 수많은 오류가 있음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절대적 선이나 악이 아니며 단지 이익에 의해 선 또는 악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저자는 이 이상적인 삶의 가능성을 ‘유럽의 근대정신’에서 발견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보내는 따끔한 충고
이 책은 고대와 중세, 근대에 이어진 유럽의 과거사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캐나다와 영국, 오스트리아에서 10여 년간 살며 직접 부딪힌 현대 유럽의 삶 이야기를 각 꼭지 마지막에 넣어두기도 했다. 저자는 이 꼭지들을 통해 한국인이 가진 선진국에 대한 환상(64쪽), 백인의 친절함에 숨은 뜻(195쪽) 등 백인 사회의 허구성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백인 사회가 느린 이유(27쪽), 영국의 반전시위의 의미(346쪽), 21세기 유럽의 위치(276쪽)를 살펴보며 우리가 유럽 사회를 통해 배워야 할 점들을 객관적으로 나열하기도 한다. 또 과연 한국인은 단군왕검을 기점으로 한 단일민족이 맞는지(224쪽),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은지(276쪽) 등을 살펴보며 한국의 민족주의와 폐쇄성,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따끔한 비판도 놓치지 않는다.
유럽사의 또 다른 축, 은비주의적 이야기
‘외전’이라는 부록을 책에 마지막에 실어놓은 점은 특이하다. 저자는 정사(正史) 못지않게 야사(野史)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사는 기록과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세상사의 큰 줄기를 그린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섬세한 감정, 우연과 착각 등 우발적 요소, 그 밖에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흐름을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는 이를 어른들의 동화일 뿐이라고 단정하지만 실제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사실 외전에 실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백인 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그들의 정신세계와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외전이라는 이름으로 본문에 포함시켰다.
외전에서는 유럽과 미국을 이끈 프리메이슨(Freemason)의 존재, 프리메이슨을 있게 한 성당기사단(Knight Templar)의 은비(隱秘)주의적 이야기, 프리메이슨의 성지가 된 프랑스 파리의 상징적인 의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숨은 비밀 등을 살펴본다. 그 어떤 교과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들은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유럽의 숨은 이야기를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