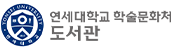핸드메이드 픽션
핸드메이드 픽션

- 저자 :박형서
- 출판사 :문학동네
- 출판년 :2012-06-02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1-28)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22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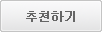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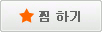
대산문학상 수상 작가 박형서 신작 소설집
이렇듯 박형서는,
21세기판 하이브리드 소설을 창조했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사실이나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라지. 이 뻔하고 빤한 상식적 정의를 앞서 꺼내든 것은 그런데 우리가 왜 소설을 읽는가, 라는 질문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저마다 소설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것’ 없이 책을 집어 들지는 않는다. 그렇다. 바로 재미다. 재미라는 흥미 없이 사람들은 쉽게 읽기의 무아에 빠지지 않는다. 독자를 붙드는 소설의 힘, 독자를 주저앉히는 소설의 힘, 그 완력 뒤에 소설가 박형서가 있다. 알고 계셨는가, 박형서 소설의 힘은, 본디 세다.
박형서는 2000년에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후 지금껏 세 권의 책을 펴냈다. 소설집 『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2003)과 『자정의 픽션』(2006), 장편소설 『새벽의 나나』(2010)가 그것이다. 앞서 두 권의 소설집으로 기괴하고 극단적인 상상력에 처연한 멜랑콜리와 유쾌한 유머를 갖췄다는 평을 받으면서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로 우뚝 섰던 그는 2010년 첫 장편소설 『새벽의 나나』로 2010년 제18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로지, 박형서의, 박형서에 의한, 여덟 편의 박형서 소설 프로젝트!
그리고 2011년 12월, 박형서의 세번째 소설집을 펴낸다. 『핸드메이드 픽션』이라는 제목 아래 2006년 겨울부터 2010년 겨울까지 그가 쓴 8편의 소설을 묶었다. 동명의 소설은 없다. “여기 실린 이야기 하나하나가 전부 나다. 내 손으로 썼다”라는 작가의 말을 참고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 소설집을 위해 그가 손수 문패 삼아 건 것이 ‘핸드메이드 픽션’이니까. 누군들 제 손으로 소설 안 쓰는 작가도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글쎄,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듯하다. 뒤쫓게 하는 거, 저기 삽을 하나 들고 밭으로 가는 한 남자가 안 보이느냐고, 삽을 들고 기웃기웃 가장 맘에 드는 땅을 고른 뒤 그 삽으로 쉴 새 없이 땅을 파고 땅을 덮는 한 남자가 안 보이느냐고, 그가 바로 박형서이며, 그 ‘삽질’이 바로 소설 쓰기임과 동시에 그렇게 일군 땅이 ‘소설’일 것이라고.
『핸드메이드 픽션』에 실린 단편들은 하나같이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준다. 일단 재밌다. 다시 봐도 재밌다. 되새김질해도 재밌다. 그러나 묘하게 어려운 데가 있다. 내 앞에서 깔깔 수다를 떨며 제 속내를 다 까발려서 쉽게 알 것만 같았는데 돌아서면 알다가도 모를 사람처럼, 그렇게 찜찜하게 어렵다는 얘기다. 스토리의 구조가 배배 꼬였거나 긴 호흡을 자랑해야 따라 읽을 수 있을 만큼 복잡다단한 문장가도 아닌데 다 읽고 책을 덮었을 때 묘하게 그의 말법을 흉내 내는 내가 있다는 거다. 이건 뭘까…… 말하자면 여운 같은 거, 일침 같은 거, 그 감동이라는 코드가 박형서의 경우에 조금 다르다는 얘기다. 이때의 중독은 그가 지은 이야기의 틀이 참으로 견고하여 내가 갇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했다는 말이 된다. 이 사태를 일컬어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권혁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유머, 순정, SF, 철학, 문학사, 신화, 정신분석, 과학, 패러디, 에세이 등의 모든 담론들을 섞고 분류하고 재배치하여 새로운 세기의 하이브리드 소설을 창조했다. 하이브리드는 본래 힘이 세다”라고.
근 4년에 걸쳐 쓴 소설들이 묶여 있는 탓에 주제별로 다양성을 자랑하기도 하는 이번 작품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변신’을 모티프로 한 소설들이다. 2011년 문인 100명이 선정한 ‘오늘의 소설’에 뽑히기도 한 작품 「자정의 픽션」을 비롯해 「갈라파고스」 또한 이 소설집에서 단연 의미 있게 읽히는 소설 가운데 하나이다. ‘성범수’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성범수’라는 이름의 멸치로 분해가며 쏟아내는 그들과 우리들의 진심 어린 토로는 일단 실소로 시작해서 진지하게 이어지는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행해보게 되는 삶이라는 이야기 꼬리잡기야 말로 박형서 특유의 장기가 발휘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래, 한때 나는 고양이였다. 불우한 거리의 고양이였다. 그리고 그는 나를 거둬들여 성범수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이고, 오랫동안 보살펴주었다. 내게서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인가? 맞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나는 당신의 외로움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많이 진화했다고. 내 말 알겠는가? 시간은 저 혼자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늘 우리의 선택과 함께 흐른다.(「갈라파고스」, 140쪽)
성범수 : 사실을 말하자면 이렇다. 우리들 죽방멸치는 다른 멸치들과 요리법에서 차이가 난다. 인간들은 다른 멸치의 경우 볶거나 튀기거나 졸여서 한 점도 남김없이 먹는 데 반해, 우리들 죽방멸치는 오로지 국물만 우려낸 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다. 이게 모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겠는가. 그뿐 아니다. 국물을 내기 전에 저들은 우리의 머리와 내장을 떼어낸다. 머리와 내장이 무엇인가? 지성과 영혼이 담긴 그릇이다. 그 신성한 부위가 살점과 척추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자정의 픽션」, 201쪽)
그만의 군더더기 없는 시적 단문, 이를 가능케 하는 예리하면서도 힘 있는 시선은 이번 소설집에서 가장 능수능란하게 제 사위를 펼친 것 같다. 컬러보다는 흑백에 가까운 이야기들, 때론 잔인하고 때론 너무나 그로테스크해 고개를 돌려버리려 하는 찰나 우리를 붙드는 그만의 유머, 그만의 천진함. 그가 유머의 달인인 까닭은 이렇게 하나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웃는 법이 없다. 우리가 너무 웃어 지쳤을 때 그렇게 나자빠졌을 때 씨익, 그제야 이빨을 살짝 내보이며 웃는 그 웃음의 조절 능력, 그 타이밍을 알고 있는 까닭이다. 박형서는 힘이 세다. 아니, 박형서의 소설은 이렇게나 무섭다
이렇듯 박형서는,
21세기판 하이브리드 소설을 창조했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사실이나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라지. 이 뻔하고 빤한 상식적 정의를 앞서 꺼내든 것은 그런데 우리가 왜 소설을 읽는가, 라는 질문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저마다 소설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것’ 없이 책을 집어 들지는 않는다. 그렇다. 바로 재미다. 재미라는 흥미 없이 사람들은 쉽게 읽기의 무아에 빠지지 않는다. 독자를 붙드는 소설의 힘, 독자를 주저앉히는 소설의 힘, 그 완력 뒤에 소설가 박형서가 있다. 알고 계셨는가, 박형서 소설의 힘은, 본디 세다.
박형서는 2000년에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후 지금껏 세 권의 책을 펴냈다. 소설집 『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2003)과 『자정의 픽션』(2006), 장편소설 『새벽의 나나』(2010)가 그것이다. 앞서 두 권의 소설집으로 기괴하고 극단적인 상상력에 처연한 멜랑콜리와 유쾌한 유머를 갖췄다는 평을 받으면서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로 우뚝 섰던 그는 2010년 첫 장편소설 『새벽의 나나』로 2010년 제18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로지, 박형서의, 박형서에 의한, 여덟 편의 박형서 소설 프로젝트!
그리고 2011년 12월, 박형서의 세번째 소설집을 펴낸다. 『핸드메이드 픽션』이라는 제목 아래 2006년 겨울부터 2010년 겨울까지 그가 쓴 8편의 소설을 묶었다. 동명의 소설은 없다. “여기 실린 이야기 하나하나가 전부 나다. 내 손으로 썼다”라는 작가의 말을 참고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 소설집을 위해 그가 손수 문패 삼아 건 것이 ‘핸드메이드 픽션’이니까. 누군들 제 손으로 소설 안 쓰는 작가도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글쎄,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듯하다. 뒤쫓게 하는 거, 저기 삽을 하나 들고 밭으로 가는 한 남자가 안 보이느냐고, 삽을 들고 기웃기웃 가장 맘에 드는 땅을 고른 뒤 그 삽으로 쉴 새 없이 땅을 파고 땅을 덮는 한 남자가 안 보이느냐고, 그가 바로 박형서이며, 그 ‘삽질’이 바로 소설 쓰기임과 동시에 그렇게 일군 땅이 ‘소설’일 것이라고.
『핸드메이드 픽션』에 실린 단편들은 하나같이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준다. 일단 재밌다. 다시 봐도 재밌다. 되새김질해도 재밌다. 그러나 묘하게 어려운 데가 있다. 내 앞에서 깔깔 수다를 떨며 제 속내를 다 까발려서 쉽게 알 것만 같았는데 돌아서면 알다가도 모를 사람처럼, 그렇게 찜찜하게 어렵다는 얘기다. 스토리의 구조가 배배 꼬였거나 긴 호흡을 자랑해야 따라 읽을 수 있을 만큼 복잡다단한 문장가도 아닌데 다 읽고 책을 덮었을 때 묘하게 그의 말법을 흉내 내는 내가 있다는 거다. 이건 뭘까…… 말하자면 여운 같은 거, 일침 같은 거, 그 감동이라는 코드가 박형서의 경우에 조금 다르다는 얘기다. 이때의 중독은 그가 지은 이야기의 틀이 참으로 견고하여 내가 갇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했다는 말이 된다. 이 사태를 일컬어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권혁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유머, 순정, SF, 철학, 문학사, 신화, 정신분석, 과학, 패러디, 에세이 등의 모든 담론들을 섞고 분류하고 재배치하여 새로운 세기의 하이브리드 소설을 창조했다. 하이브리드는 본래 힘이 세다”라고.
근 4년에 걸쳐 쓴 소설들이 묶여 있는 탓에 주제별로 다양성을 자랑하기도 하는 이번 작품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변신’을 모티프로 한 소설들이다. 2011년 문인 100명이 선정한 ‘오늘의 소설’에 뽑히기도 한 작품 「자정의 픽션」을 비롯해 「갈라파고스」 또한 이 소설집에서 단연 의미 있게 읽히는 소설 가운데 하나이다. ‘성범수’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성범수’라는 이름의 멸치로 분해가며 쏟아내는 그들과 우리들의 진심 어린 토로는 일단 실소로 시작해서 진지하게 이어지는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행해보게 되는 삶이라는 이야기 꼬리잡기야 말로 박형서 특유의 장기가 발휘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래, 한때 나는 고양이였다. 불우한 거리의 고양이였다. 그리고 그는 나를 거둬들여 성범수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이고, 오랫동안 보살펴주었다. 내게서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인가? 맞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나는 당신의 외로움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많이 진화했다고. 내 말 알겠는가? 시간은 저 혼자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늘 우리의 선택과 함께 흐른다.(「갈라파고스」, 140쪽)
성범수 : 사실을 말하자면 이렇다. 우리들 죽방멸치는 다른 멸치들과 요리법에서 차이가 난다. 인간들은 다른 멸치의 경우 볶거나 튀기거나 졸여서 한 점도 남김없이 먹는 데 반해, 우리들 죽방멸치는 오로지 국물만 우려낸 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다. 이게 모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겠는가. 그뿐 아니다. 국물을 내기 전에 저들은 우리의 머리와 내장을 떼어낸다. 머리와 내장이 무엇인가? 지성과 영혼이 담긴 그릇이다. 그 신성한 부위가 살점과 척추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자정의 픽션」, 201쪽)
그만의 군더더기 없는 시적 단문, 이를 가능케 하는 예리하면서도 힘 있는 시선은 이번 소설집에서 가장 능수능란하게 제 사위를 펼친 것 같다. 컬러보다는 흑백에 가까운 이야기들, 때론 잔인하고 때론 너무나 그로테스크해 고개를 돌려버리려 하는 찰나 우리를 붙드는 그만의 유머, 그만의 천진함. 그가 유머의 달인인 까닭은 이렇게 하나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웃는 법이 없다. 우리가 너무 웃어 지쳤을 때 그렇게 나자빠졌을 때 씨익, 그제야 이빨을 살짝 내보이며 웃는 그 웃음의 조절 능력, 그 타이밍을 알고 있는 까닭이다. 박형서는 힘이 세다. 아니, 박형서의 소설은 이렇게나 무섭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